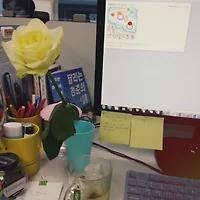△ (첫번째 사진) 새우가스냐 새우까스냐. 돈가스가 맞는 표현인데, 사진에 떡하니 새우까스가 눈을 똥그랗게 뜨고 날 바라보고 있으니.
끙끙거리며 고민하는 내 모습이 웃겼는지 다들 웃었다. 그리고 새우가스는 새우까스가 되기로.
또 벌써 저녁이 왔다. 며칠째 똑같은 원고를 몇 번이나 돌려가며 보고 있자니 '어, 이거 왜 봤던건데 나한테 다시 줘?' 라고 교정지를 들여다보면 내 흔적이 없다. 3교구나. 그제도 보고 어제도 보고 오늘 아침에 다시 보고 이제는 하도 봐서 지겨운 원고를 또 들여다보고 또 수정을 한다. 더 매끄럽고 간결한 문장, 더 어울리는 단어. 더 적합한 문장부호의 사용... 사랑에 빠져도 이 정도로 들여다보진 않겠네. (뭐, 미남이면 얘기가 다르겠다만.) 오늘은 대체 몇 번째 교정인지. 총 원고를 세 등분으로 나눠 네명이서 빙글빙글 시계방향으로 돌려가면서 보는데, 이걸 하루종일 하고 있노라면 어느새 저녁해가 똑 떨어진다. 점심 먹고 돌아서면 저녁 메뉴를 고민한다. (지금은 막 네네치킨을 시켰다.)
예전 출판사를 다닐 때 주간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. 주간님은 평생을 편집자로 사신 분인데 남의 글을 만지노라면 어쩔때는 '남의 똥이나 닦는 기분이 든다'는 것이다. 충분히 이해할만하다. 남의 글을 이렇게 저렇게 멋드러지고 아름답게 바꾸어도 그 몫은 고스란히 작가에게 돌아가니까. 출판사에서 3년간 몸담으며 알게된 사실은, 작가들은 사실 글을 그리 잘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. 잘 쓰는 사람도 의외로 드물고.
나도 편집자로 살기는 힘들겠구나, 라고 느낀 지점이 작년에 어느 출판사의 일을 도우면서였달까. 한달정도 몇 사람의 인터뷰를 따고 - 한 번 딸 때 네 시간이었으니 말 다했다 - 원고를 다 썼는데 결과물은 고스란히 작가 것이 되는게 싫었다. 무지 싫었다. 어느 잡지사 들어가서 일할 때의 느낌과 비슷했다. 글을 빨리 쓰니까 상사들 글까지 다 맡아 썼는데 그게 이름은 다 그 사람들꺼가 되는 거. 글 도둑질이잖아. 그거. 존심 상해서 못하겠다고 하고 나왔는데,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그 정도도 못 굽히면 앞으로 어떡하냐고 끌끌 혀를 찼더랬다. 내가 언제 허리 못 굽힌댔니.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싫어. 내꺼 내꺼라고 못하는 거.
어제는 밤 열한시를 넘겨 퇴근했다. 집에 오니까 빙글빙글 쓰러질 것 같은데다, 밤이 늦어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한겹 더 슬프게 했다. 작은 소리로 기타를 조금 치다가 - 누가보면 음악 혼에 불타는 줄 알겠네 - 쓰러져 잠이 들었다. 오늘도 벌써 밤 여덞시를 넘겼다. 읽기에 껄끄러운 문장들을 정리하고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매만진다. 피곤해서 죽을 것 같다. 나는 늘 똑같은 노래를 듣는 버릇이 있다. 특히 집중해야 할 때 하루종일 똑같은 노래를 듣는다. 수백번을 듣는다. 요즘 듣는 노래는 우습지만, 며칠전 내가 기타를 어설프게 뜯으며 부른 노래 한 곡과 어떤 사람이 기타를 치며 부른, 내가 무척 좋아하는 노래 한 곡. (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 유투브 조회수가 500회 이상은 올라갔을꺼다.)
음악에 질감이 있다면 맨질맨질 닳아버릴 것만 같다. 나는 똑같은 음악을 또 귀에 꽂는다. 그래도 이 일이 싫지가 않다. 미친.
'오늘의 날씨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2015년 7월 31일 : 유선의 날 (0) | 2015.07.31 |
|---|---|
| 2015년 7월 30일 : 저...저... 웆... (4) | 2015.07.30 |
| 미스판의 판타지아 : 나도 반얀트리에 올라가보자 (0) | 2015.07.29 |
| 2015년 7월 28일 : 오늘 왜 이래 (0) | 2015.07.28 |
| 2015년 7월 27일 : 여름의 맛 (0) | 2015.07.27 |